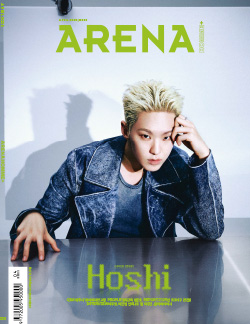JEEP Wrangler ‘41 Edition
랭글러는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소유욕이 생기는 자동차다. 출중한 험로 주파력 때문만은 아니다. 열에 아홉은 각진 디자인에 매료된다. 최근 보기 힘든 차량 디자인인 건 분명하다. 21세기는 유선형의 시대 아닌가. 게다가 전기차가 등장하며 공기역학은 미덕이자 방향성이 됐다. 그럼에도 고전적 디자인만의 감흥은 사라지지 않는다. 랭글러가 특별한 이유는 더 있다. 디자인에 이야기가 담긴 까닭이다. 전장에서 태어나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면서 여전히 흙길을 누빈다. 그때 그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랭글러 ′41 에디션은 ‘올리브 드랩’ 색상을 입어 더욱 향수를 자극한다. 물론 랭글러의 시조인 윌리스 MB와 지금 랭글러는 꽤 다르다. 크기도, 세부 요소도, 인테리어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 그럼에도 운전석에 앉아 각진 보닛을 보며 달리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는 점은 같다.
FERRARI 296 GTB
페라리와 붉은색은 지구가 푸른색인 것처럼 자연스럽다. ‘로쏘 코르사’로 불리는 페라리의 붉은색은 그 시작을 따지면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출신 국가별로 레이싱카 색상을 통일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붉은색, 프랑스는 파란색, 독일은 은색, 영국은 녹색. 물론 시간이 지나 그 규정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페라리는 꾸준히 붉은색을 내세웠다. 페라리 고향인 마라넬로에 가면 붉은색 천지다. 그곳에 있는 페라리 공장마저 붉은색 벽돌로 세웠을 정도니까. 로쏘 코르사를 입은 296 GTB는 시선을 빨아들인다. 낮은 차체와 넘실거리는 곡선은 붉은색을 만나 시각적 쾌감을 증폭한다. 물론 자극은 운전할 때 더 진해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출발할 땐 조용하다. 그러다가 가속페달을 깊게 밟으면 엔진이 포효한다. 조용하다 갑자기 사자후가 덮치니 가슴을 더 후빈다.
MINI Cooper S
1959년 알렉 이시고니스 경은 미니를 세상에 선보였다. 설계 철학이 분명했다. 성인 4명이 타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소형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엔진을 가로로 배치해 앞바퀴를 굴렸다. 각 바퀴도 차체 끝으로 최대한 밀었다. 미니의 형태는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결과였다. 그렇게 작지만 유용한 국민차가 탄생했다. 지금 미니의 위치와는 조금 다른 시작이다. 하지만 디자인은 예나 지금이나 앙증맞다. 과거 디자인을 지금까지 계승하는 차종은 드물다. 미니가 국민차가 아닌 개성 강한 특별한 모델이 된 이유다. 동그란 헤드램프와 쫑긋 세운 앞유리, 간결한 형태는 미니를 미니답게 하는 요소다. 실내 역시 과거 디자인 요소를 계승했다. 실내 가운데를 차지한 원형 디스플레이가 그 증표다. 미니가 발랄한 또 다른 이유는 색이 다채롭다는 점이다. 무채색이 어색한 몇 안 되는 자동차. 도로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MERCEDES-BENZ CLE 450 4Matic Cabriolet
고급 자동차를 요트에 비유할 때가 있다. 실제로 요트에서 영감받아 자동차를 빚을 때도 있다. CLE 450 4매틱 카브리올레 역시 요트와 겹쳐진다. 일단 컨버터블 형태 덕분이다. 소프트톱을 열면 요트처럼 실내가 드러난다. 요트나 컨버터블이나 바람을 맞으며 나아간다. 또한 요트든 자동차든 고급일수록 소재에 신경 쓴다. CLE 450 4매틱 카브리올레의 갈색 시트는 고급 요트의 나무 바닥처럼 진중한 고급스러움을 전한다. 하나 더 꼽자면 늘씬한 측면이다. 과하게 부풀리거나 뾰족하게 벼리지 않았다. 공이 이동하며 남긴 잔상처럼 앞에서 뒤로 매끈함이 쭉 이어진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나타나는 측면의 캐릭터 라인이 속도감을 표현할 뿐이다. 요트가 겹쳐지는 건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다. 운전할 때 도로를 유영하듯 달리는 감각도 그 느낌에 일조한다. 파란색 차체가 꼭 물빛 같아서 더.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